[경인일보] [풍경이 있는 에세이]선재길, 화엄(華嚴)을 꿈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8-04-06 08:53 조회8,593회 댓글0건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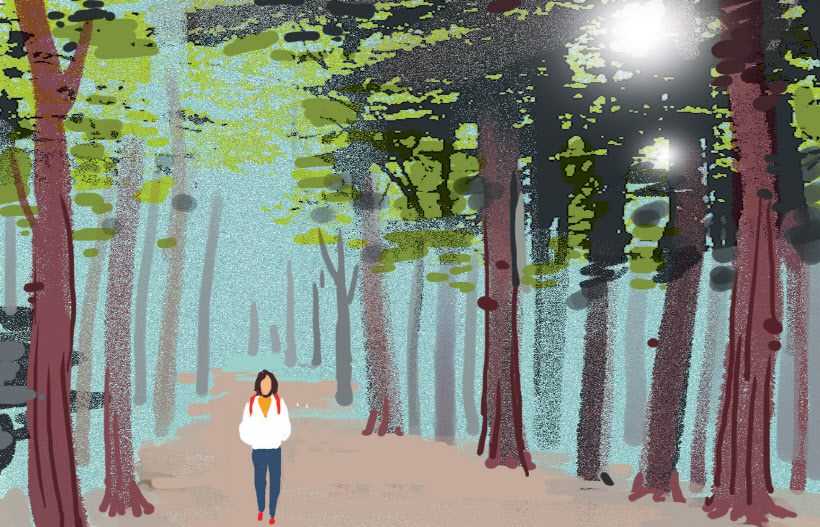 |
천년의 숲 계곡따라 흘러가고
오솔길도 바람따라 흘러가는 길
적멸은 저 높은곳에 있거니와
옛길 홀로 걷는 동안 내 마음은
햇살같은 평안이었음을 깨닫는다
 |
| 김인자 시인·여행가 |
오대산 월정사 천년의 숲을 살짝 비껴 왼쪽 구름다리를 시점으로 상원사까지 이어지는 선재길(옛길)은 천년 고찰 월정사와 월정사의 말사인 상원사를 잇는 약 10km의 야트막한 숲길이다. 이 길은 차도가 생기기 전까지 월정사와 상원사를 오가던 불자(佛子)를 위한 구도의 길이었다.
그날 나는, 동안거가 끝나는 스님처럼 대관령을 벗어나 선재길을 걷고픈 마음에 잠을 설쳤다. 이른 아침, 월정사 일주문 밖에 차를 두고 전나무들의 환영을 받으며 '천년의 숲'부터 걷기 시작했다. 시간이 길수록 가속을 더하는 걸음은 풍경이 알아서 제지해 주었다. 월정사 경내를 둘러본 후 지장암을 지나 회사거리에서 얼음이 풀린 계곡으로 내려서자 도처에 봄의 전령인 버들강아지가 행자를 반긴다. 산이 깊어 그런가, 기온으로 치자면 계절은 봄보다 겨울에 가깝다. 하지만 숲의 내장까지 비추는 햇살이 있어 견딜만하다.
걷는 내내 조릿대와 이제 막 흙을 박차고 올라오는 새싹들이 수런수런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천년의 숲이 계곡을 따라 흘러가고 오솔길도 구불구불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 선재길, 이 숲길은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이야기처럼 나직이 이어진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몇 개의 나무 데코를 지나 출렁다리를 지나 섶다리를 건너고 다시 연화교를 건너 동피골을 지나자 비로소 상원사주차장에서 평탄한 길은 끝난다. 상원사로 이어지는 오르막에선 다시 양쪽으로 도열해있는 전나무들이 기다린다. 사철 초록을 고집하며 천년을 산다는 전나무는 우람하기 그지없고, 온갖 고난에 맞서는 품새에선 포용과 기품이 넘친다.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결기가 느껴져 쉬이 범접할 수 없다. 이쯤에서 예까지 온 걸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예감치 못할 자는 없으리라.
나는 구간을 세 파트로 나누어 4시간쯤 걸었다. 겨우내 쉰 탓인지 중간에 무거운 두 다리가 애를 태웠지만 모른 척했다. 걷는 내내 구름이 쫓아오고 도처에 화엄의 세계에서 속세로 나갈 수 있는 다리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린 건 숨기지 않겠다. 잠시 걸어도 이런데 그 옛날 세속의 연을 끊고 수행을 위해 오가던 스님들의 마음은 오죽했으랴. 그러나 이 길이 좋은 건 마지막 구간을 제외하면 고저 없이 평탄해 나 같은 사람이 무위자연(無爲自然)하며 걷기엔 이래도 되는가 싶을 만큼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다는 것. 바람은 헤살스럽지만 숲의 속살에 닿는 빛을 고마워하며 오후엔 한결 온순해진 숲과 포실해진 흙이 두 다리에 힘을 실어 주었다.
숲이라고 어디 나무만 있으며 절이라하여 부처님만 계시겠는가. 월정사 경내 팔각 구층석탑으로 눈이 호사를 했으니 상원사의 보물 동종도 놓치지 말아야지. 상원사 고양이석상 곁에 서서 든든한 백두대간 등줄기를 배경으로 단정히 서있는 석탑을 바라보노라니 숲길을 걸을 때와는 다른 감동으로 가슴이 차오른다. 걸을수록 산은 깊어지지만 그만큼 멀어지는 세속의 거리, 그러고 보니 숲에 머물렀던 시간 그 자체가 화엄이 아니었을까도 싶다. 쉬엄쉬엄 걷고자 했으나 거친 발이 욕심을 부려 힘들게 궁기를 지냈을 어린 짐승들이 놀라 달아나게 한 건 내 잘못이 크다. 그러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야하는지 잠시 길을 잃기도 하였다.
늦은 오후, 선재길이 끝나는 상원사 석탑 앞에 섰을 때 알 듯 모를 듯한 그것, 지금 눈앞에 펼쳐진 진경이 화엄이라면 내가 휘정거리며 온 저 길도 화엄이었을까. 하지만 다 왔구나 싶은 이곳도 결코 끝이 아니었던 겐지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스님께서 타이르듯 일러주신다. 저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보라고,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신성한 곳 적멸보궁(寂滅寶宮)이 기다릴 거라고. 적멸(寂滅)이라니, 모든 번뇌가 사라진 마음 상태, 즉 보배로운 궁전을 일컫는 적멸보궁, 그러니까 적멸은 닿을락말락하는 저 높은 곳에 있기도 하거니와 옛길을 홀로 걷는 동안 내 마음 안에 깃든 구름 같고 햇살 같은 평안이었음을 비로소 알아차린다. 선 자리에서 조금만 오르면 있을 피안은 마음 안에 고이 묻어둔 채 옷깃을 여미고 하산을 서두른다. 화엄을 여기 두고 또 다른 화엄을 꿈꾸며 저잣거리로 돌아가려는 나는 대체 누구이며 무엇인가.
/김인자 시인·여행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